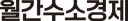지난 11월 2일은 수소의 날이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기업, 연구기관, 정부가 각자도생하는 게 아니라 수소 생산, 저장·운송, 활용 등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의미다.
수소의 날을 전후해 굵직한 소식이 이어지며 인프라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청정수소발전시장(CHPS) 경쟁입찰 취소,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등 정책 이정표가 제시됐고, 고압 수소 출하 설비 가동,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 산업계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외 사례는 인프라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일본은 ‘수소사회추진법’과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발전소 혼소 기술을 제도권에 편입하고, 경제산업성과 NEDO가 실증사업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중국 역시 ‘풍광제수소(풍력, 태양광 등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쌍탄소(2030 탄소 피크, 2060 탄소중립을 통칭하는 말)’ 전략 아래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기지, 장거리 수소 송관망 프로젝트 등 수소 생산과 활용을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하고 있다.
국내 산업계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그린수소 생산기지, 삼성E&A의 H2COMPASS, 현대차그룹의 HTWO Grid 등 수소산업 전주기를 통합하는 사업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한국의 개별 기술 수준은 경쟁력이 높지만 이를 연계해 밸류체인을 강화할 제도 구축은 여전히 미흡하다.
수소경제는 결국 인프라의 문제다. 개별 발전소, 충전소, 시범 사업만으로는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 정부가 수소법과 청정수소발전시장, 탄소중립산업법을 하나의 축으로 묶어 중장기 인프라 로드맵을 제시하고, 배관망 구축과 발전소·산업단지 연계 전략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책의 일관된 방향 아래에서만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투자와 기술 개발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 수소경제 논의의 초점을 ‘몇 MW를 설치할 것인가’에서 ‘어떤 인프라를 깔아서 무엇을 연계할 것인가’로 옮겨가야 한다.